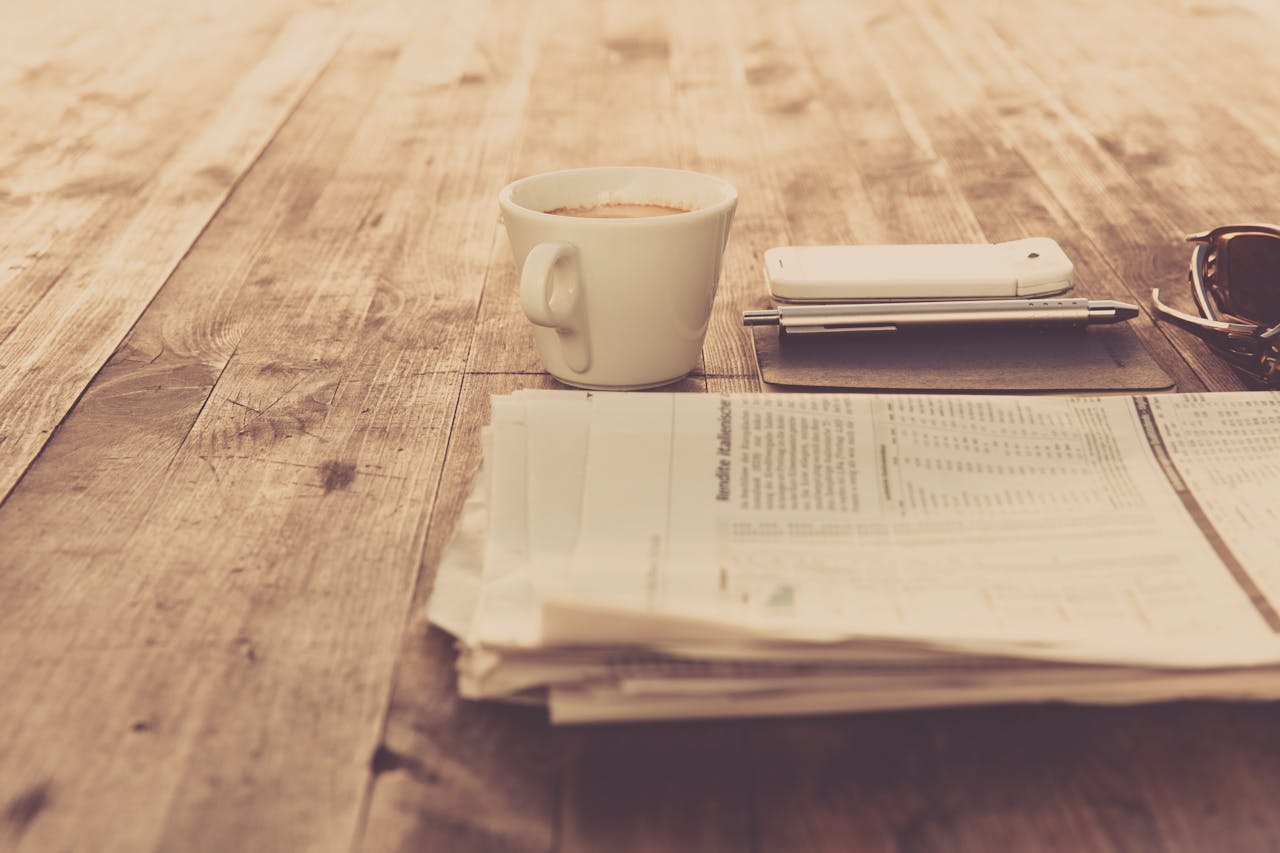뉴스를 본다. 언제나처럼, 제목은 굵고 화려하다. 충격, 돌발, 속보. 수십만 명이 클릭하고, 몇 시간 뒤에는 잊는다. 하지만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 화면 뒤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름들은 누구보다 오래, 조용히 살아간다는 걸.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 통계에도 나오지 않고, 토론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는 건, 때로 뉴스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 왜냐하면 사회를 움직이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라, 말없이 하루를 지탱하는 이름 없는 손들이기 때문이다.
화면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
지난겨울, 역 근처에서 만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플라스틱 병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운 낯선 거리감. 그런데 그분이 말했다. “신문은 늘 중요한 일만 다뤄. 근데 나한텐 오늘이 제일 중요하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뉴스는 늘 ‘큰일’을 다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이 전부다. 하루를 버티는 일, 내일을 걱정하는 일, 계절을 넘기는 일. 그들의 삶이 뉴스에서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회의 절반을 놓치는 건 아닐까.
숫자와 이름 사이의 간극
보고서에는 늘 숫자가 있다. 예컨대, 통계청 2025 고용동향은 “청년 실업률 7.4%”라고 말한다. 하지만 7.4%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다. 한 사람의 실패, 고민, 새벽의 불안, 부모에게 말 못 하는 자책 같은 건 거기 없다.
숫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빈칸에 있다. 우리는 ‘7.4%’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삶을 상상해야 한다. 그게 진짜 뉴스다.
도시가 지워버리는 것들
서울 한복판에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 재개발로 철거된 골목, 버스 노선에서 빠진 마을, 지도에서 사라진 지명. 도시의 발전이라 부르는 것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터전을 잃고 떠난다. 하지만 뉴스는 “사업 속도”나 “이익률”만 다룬다.
나는 가끔 낡은 골목을 일부러 걸어본다. 이름이 지워진 간판, 문 닫힌 가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다. ‘발전’이란 단어로 포장된 속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무엇일까. 그 질문이 나를 자주 붙잡는다.
잊히는 이들의 공통점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둘째, 말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 셋째, 듣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진다. 누구도 악의를 가진 건 아니지만, 구조가 그렇게 만든다.
언론이 그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도 이해한다. 클릭이 안 되고, 조회수가 낮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잃는 건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결국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한 사람의 삶이 가진 무게
작년 여름, 지방 도시에서 만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통계에도,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근데 나도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뉴스가 다루지 않는다는 건, 그 존재가 사소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세상이 관심을 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진다. 공감의 근육이 약해지고, 연대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듣고 있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거대한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려는 태도 자체가 사회를 조금은 다르게 만든다고 믿는다.
뉴스가 다루지 않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다루면 된다. 언론이 못 보는 사각이라면, 우리가 들여다보면 된다. 결국 언론도 사회의 일부이고, 사회를 이루는 건 우리니까.
데이터 뒤의 사람을 보는 법
저는 요즘 뉴스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묻는다. “이 기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은 누구일까?” 정책 기사라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경제 기사라면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을, 문화 기사라면 무대 밖의 사람을 떠올린다. 그렇게 하면 뉴스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예를 들어, OECD 고용전망 보고서를 읽을 때도,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 아래의 사람을 상상한다. ‘비정규직 비율 26%’ 뒤에는 계약 연장을 기다리는 수많은 얼굴이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문장 뒤에는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누군가의 시간이 있다.
뉴스가 다루지 않는 뉴스
나는 때때로 뉴스 자체를 뉴스처럼 읽는다. 무엇을 다루지 않는가?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지 않는가? 어떤 시선을 배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뉴스의 뒷면을 보여준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한다.
그건 때로 거리의 노숙자일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일 수 있으며, 혹은 고립된 청년일 수 있다. 모두 ‘사건’이 되기 전까지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건이 되고 나서는 너무 늦다.
연결이라는 이름의 책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연결하는 것이다. 뉴스와 삶을, 숫자와 이름을, 화면과 현장을. 연결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대화, 한 줄의 글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일. 그게 시작이다.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바뀐다.
마지막 문장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말해주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얼굴이 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떠올릴 때 비로소 사회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해는 더 나은 내일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러니 오늘도 묻는다. “이 뉴스의 그림자에는 누가 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그 질문에서 변화가 시작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