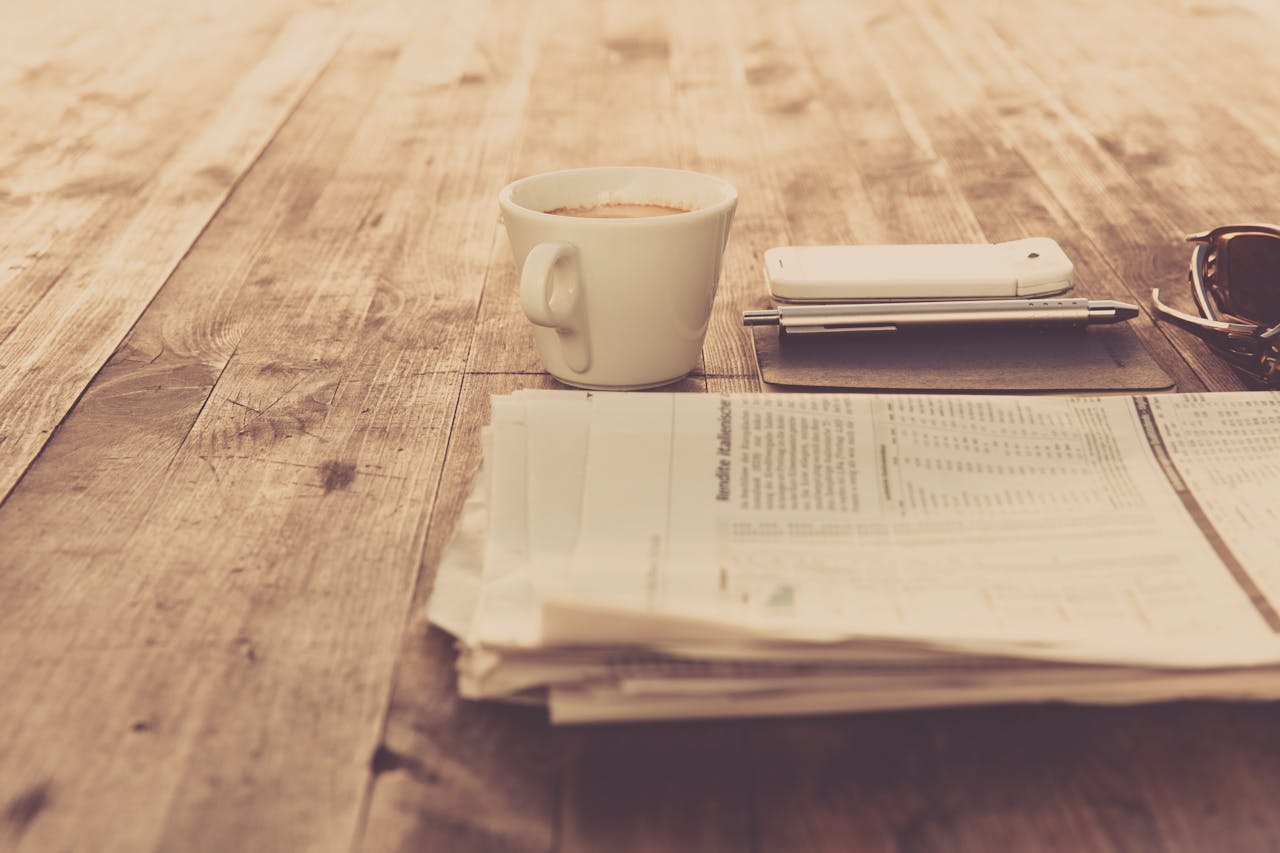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다들 불안해.” 뉴스에서도, 회사에서도, 카페에서도. 말끝마다 불안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나도 불안하다. 이유를 정확히 짚지 못하는 날도 많지만, 몸이 먼저 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장이 빨리 뛴다. 마치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기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불안의 정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동시에 아주 단순하다. 너무 빠르고, 너무 많고, 너무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빠른 세상,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
우리의 하루는 늘 속도와 싸운다. 이메일 답장은 10분 안에, 채팅은 읽자마자, 콘텐츠는 하루에 몇 개씩. 정보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그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점이다. 기계처럼 모든 걸 처리할 수도 없고, 24시간 업데이트를 따라갈 수도 없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속삭인다. SNS는 늘 새 소식을 올리고, 뉴스는 실시간 속보를 내보낸다. 조금만 늦어도 소외된 것 같고, 남보다 느리면 실패한 것 같다.
이 속도감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늘 뭔가 부족하고, 놓치고,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현대인의 기본값이 되었다.
비교라는 이름의 독
또 하나의 불안은 비교에서 온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눈앞에 펼쳐진다. 친구의 연봉, 동기의 승진, 낯선 사람의 여행 사진, 타인의 성공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을 평가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잘난 사람보다 못하면 초조하고, 잘난 사람보다 잘해도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난다. SNS 피드는 끝없는 트랙이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우리는 이미 비교 속에 살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보고서) 이는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다. 비교는 자기 인식을 왜곡시키고, 만족감을 빼앗고, 성취감을 무력화시킨다.
정보 과잉, 생각할 틈을 빼앗기다
뉴스를 켜면 헤드라인이 수십 개다. 알림창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울린다. SNS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 모든 정보가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몰려온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우리가 더 현명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너무 많은 정보는 사고를 흐리게 만들고, 판단을 어렵게 한다. 정보 과잉 상태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다시 불안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일부러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하루 한 번만 뉴스를 보고, 알림을 꺼두고, 필요 없는 소식은 과감히 지나친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다. 중요한 건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불안은 약점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부끄러워한다. 마치 불안해하는 것이 미숙함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 불안은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은 위험을 대비하라는 몸의 경고이고, 변화에 적응하라는 마음의 반응이다. 문제는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피하거나 무시하려 하면 더 커지고, 인정하고 다루면 작아진다. 결국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장된 생존 도구다.
작은 루틴이 만드는 안정감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내가 해본 방법 중 효과가 있었던 건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 뉴스를 하루 한 번만 확인하는 것
-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는 것
- 비교를 유발하는 SNS를 하루 1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것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집중 리스트에 적는 것
루틴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작은 규칙이 큰 변화를 만든다.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주고, 그 감각이 불안을 줄인다.
연결의 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불안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 하나는 ‘관계’다. 우리는 혼자일 때 훨씬 더 불안하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불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화는 생각을 정리해주고, 공감은 감정을 가볍게 한다.
지인과의 짧은 대화,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포럼 참여… 형태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꺼내놓는 경험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위안을 준다.
Pew Research: 사회적 연결과 정신 건강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 수준이 평균 40% 낮았다. 우리는 혼자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불안을 다루는 다섯 가지 질문
나는 불안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진다.
- 지금 이 불안이 실제 위험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예상에서 오는 것인가?
-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이 불안이 내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내일 이 불안이 지금만큼 클까?
- 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불안을 없애지 않는다. 대신 불안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이해 가능한 것은 다룰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견디는 존재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불안을 견디는 역사이기도 하다. 전염병, 전쟁, 경제위기, 기술 변화… 그 모든 시대를 인간은 살아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
지금 이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불안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덜 무서울 수 있다.
마지막 문장
어쩌면 불안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고민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질문하고, 고민하고, 흔들린다. 그 흔들림 속에서 결국 길을 찾는다.
그러니 오늘도 불안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불안 속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견뎌낼 것이다.